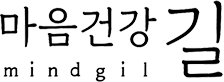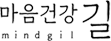사법시험의 면접관이 되어 판검사가 될 사람들의 품성을 심사해 본 적이 있다. 그들의 기본의식은 철저한 정의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사회가 요동칠 때 돛이 아니라 배를 고정시키는 닻이어야 하는 게 법조인이기 때문이다. 그 닻은 정의라는 바위에 고정되어 있어야 했다.
“지망이 뭡니까?”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사람에게 물었다. 판사나 검사가 될 그가 아마도 평생 가장 공손한 순간일지도 모른다.
“검사가 되겠습니다.”
“왜 검사가 되려고 합니까?”
내가 앞에 오는 사람들에게 고정적으로 물었다. 대부분이 앵무새 같이 정의라는 단어를 뱉어냈다. 내가 이런 질문을 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옆 사무실에 있는 동료검사가 그 사건을 담당한다고 칩시다. 그 검사에게 아버지를 봐달라고 청탁을 할 겁니까?”
그 질문을 받은 대부분이 순간 당황하며 면접관인 나의 눈치를 살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 검사인 아들이나 사위에게 잘 말해주겠다면서 돈을 받아 챙긴 부모들을 보기도 했었다.
“절대 부탁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정의니까요”
내 눈치를 보고 한 대답 같았다.
“아무리 정의라고 해도 수십년간 뒷바라지를 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정 깊은 아버지인데 인간적으로는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
“그건 그러네요”
수험생의 태도가 금세 동조하는 빛을 띠면서 누그러졌다.
“그런데 검사의 옷을 입고서 청탁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의 사회 분위기가 공직자가 전화 한 통만 해도 직권남용이니 하면서 문제가 되는 사회인데. 힘없는 사람은 엄격한 법의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빽을 가진 사람은 법의 위에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
“그것도 그러네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세상에 내세우는 이론적 정의와 가족에 대한 정의가 달라야 하는 건가? 추상적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구체적으로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정의는 달라져야 하는 건가?”
그런 게 내가 삼십년 동안 법의 밥을 먹으면서 보아왔던 고무줄 정의였다. 흔히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과도 맥락이 비슷하다고 할까.
“도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면접관님은 그런 상황이면 어떤 게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오히려 면접관인 나에게 되돌아 질문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면접관이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말했다.
“검사의 사표를 내야지. 검사 옷을 입은 채 청탁을 하면 안되지. 변호사가 되어 얼마든지 아버지를 변호할 수 있잖아? 그게 바른 태도 아닐까?”
“내가 미쳤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검사가 되겠다는 사람뿐 아니라 판사지망생들도 마찬가지의 의식이었다. 그들의 내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판사나 검사라는 지위인 것 같이 보이기도 했다. 그들이 정의를 말하는 것은 입에서만 나오는 수식어 같기도 했다.그들 대부분은 정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성경 속의 예언자들은 정의가 서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랑하던 조국의 멸망도 기탄없이 예언했다.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은 그렇게 공정하게 재라고 들고 있는 게 아닐까.
 글 | 엄상익 변호사
글 | 엄상익 변호사
경기중-고, 고려대 법대를 나오고 제24회 사법시험(1982)에 합격했다. 6공 때,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특별보좌관실에 근무하며 권부의 이면을 보았다. 변호사를 하면서 ‘대도 조세형’, ‘탈주범 신창원’ 등 사회 이목을 끌은 대형사건 피의자들을 변호했다. 글쓰기를 좋아해 월간조선을 비롯,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에 칼럼을 연재했고 수필집, 장편 소설 등 10여권의 책을 저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