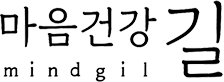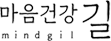낡은 삼등열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한 적이 있다. 차창 밖으로 눈 덮인 자작나무와 소나무숲이 끝도 없이 지나갔다. 은세계가 된 눈벌판을 보고 눈가에 이슬이 맺혔던 영화 속의 닥터 지바고를 보면서 언젠가 그런 곳에 가보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붉게 황혼이 내릴 무렵 드넓게 누워있는 지평선으로 거대한 해가 내려앉고 있었다. 주홍빛의 거대한 해가 지평선에 반쯤 잠겨들어 있을 때였다. 거대한 붉은 해를 배경으로 그 안에 장난감 같은 집들과 나무들이 검은 실루엣으로 장난감같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었다.
자연이 품어주는 인간 세상의 모습이었다. 그 한 장면 만으로도 한 달에 걸친 시베리아 횡단의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 같았다. 사진작가가 한 장면을 위해 모든 걸 바치듯 나는 내 눈에 시린 한 광경을 보기 위해 여행을 다녔다.
빙하가 보고 싶어 알래스카의 깊은 계곡으로 간 적이 있었다. 작은 보트를 빌려 빙하가 녹아 떠내려오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다. 신비한 녹색의 빛을 품은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유유히 떠내려오고 있었다.
그 신비한 빛에 영혼이 녹아드는 느낌이었다. 나는 보트를 녹색 빛이 은은히 뿜어져 나오는 빙산에 대고 신비의 나라로 간 소년같이 손바닥으로 빙하를 만져보았다. 나는 뷰파인더의 렌즈를 통해 자연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속에 그때의 촉감이나 서늘함 등을 고이 간직한다.
영혼의 사진첩에는 그런 광경들이 제법 보관되어 있다.
사십대 중반 야산의 빈 나뭇가지에 어린 새잎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봄날이었다. 나는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고 있었다. 갑자기 눈이 열린 듯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길옆의 야산에 수채화처럼 퍼지는 연두색의 잎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걸 처음 보았다. 차창 밖으로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이 평화롭게 떠가는 걸 처음 본 느낌이었다. 어떻게 저런 경이가 있을까 처음으로 생각한 순간이었다.
봄은 매년 찾아왔지만 그걸 보지 못한 내게 봄은 없었던 것 같았다. 아니 젊은날 일순간 아련한 분홍색으로 떨어져 내리는 벚나무의 꽃비를 봤지만 야망과 이성으로 눈꺼풀을 스스로 덮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날 수술대 위에서 나는 결심했다. 다시 살아난다면 자연을 마음껏 즐기겠다고. 나의 영혼은 어느 날 우연히 이 지구별에 온 것이다. 온갖 색채와 빛이 넘쳐나는 지구별에 묵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구별 곳곳을 부지런히 다니며 구경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많은 인생일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 후부터 여행비만 벌면 길을 떠났다. 영혼의 사진첩에 한 장면 한 장면을 집어넣었다. 모래사막에서 밤을 지샌적이 있다. 보랏빛 섞인 하늘 가득히 보석 같은 별들이 반짝였다.
시간이 흐르고 하늘 한가운데 하얀 달이 나타났다. 사막의 달은 무심해 보이는 내성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었다.
밤의 사막은 서늘해 보이는 달빛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 달과 별을 보면서 나는 지구라는 별 자체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신없이 바빴던 그동안의 삶은 마치 금고속에서 우주여행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바다를 흐르기도 했다. 언덕만한 파도가 무겁게 몸을 뒤채면서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는 태평양을 건넜다. 타는 듯한 빨강의 부겐빌리아가 싱싱하게 피어있는 타히티 섬에서 죽은 고갱의 영혼을 찾기도 했다.

천국의 모습을 복사한 것 같은 보라보라섬에 가서 산호초에 둘러싸인 에메랄드빛 바닷물에 몸을 담그기도 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자라던 유년의 내가 꿈꾸던 풍경이었다. 영화 포스터 속의 잔물결이 이는 남태평양의 저녁노을에 물든 바다를 보면서 황홀했었다.
소년시절 동네에는 악취 나는 개천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도 밤이면 그 개천의 둑을 거닐며 물 위에 내려앉아 조금씩 흔들리는 별을 보곤 했었다. 나는 뒤늦게 자연을 사랑했던 사람을 알게 됐다.
하바드대를 졸업한 소로우는 콩코드의 호숫가에 오두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글을 썼다. 그가 쓴 ‘월든’이라는 책에서는 잔물결이 이는 맑고 투명한 호수가 있고 눈 덮인 나뭇가지를 옮겨 다니는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일생을 산속의 오두막에 살았던 법정 스님의 책에서는 그의 친구인 후박나무가 잎의 푸르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았다.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자연은 신 자체이거나 신의 최고의 걸작품인 것 같다.
바위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제비꽃은 하나님의 미소다. 아침 햇빛에 반짝이는 이슬은 그분의 보석이다. 숲을 지나가며 내는 바람의 파도소리는 그분의 말씀이다. 자연은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 같다.
자연은 인간을 지탱하고 먹이고 공중을 나는 새는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의 만족을 가르치기도 한다. 여행을 다녀오면 남는 게 사진이다. 다른 것들은 가지고 가지 못해도 지구별을 구경했던 그 기억의 사진들은 어쩌면 죽음 저쪽으로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구별 나그네의 인생 지친 다리를 이끌고 지금도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있다.
 글 | 엄상익 변호사
글 | 엄상익 변호사
경기중-고, 고려대 법대를 나오고 제24회 사법시험(1982)에 합격했다. 6공 때,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특별보좌관실에 근무하며 권부의 이면을 보았다. 변호사를 하면서 ‘대도 조세형’, ‘탈주범 신창원’ 등 사회 이목을 끌은 대형사건 피의자들을 변호했다. 글쓰기를 좋아해 월간조선을 비롯,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에 칼럼을 연재했고 수필집, 장편 소설 등 10여권의 책을 저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