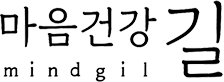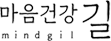올해 우리 국민은 위스키를 더 마시고 와인을 덜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키에 탄산수 등을 넣은 '하이볼'이 인기를 끈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불었던 '와인 열풍'은 다소 잠잠해진 모습이다.
23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스카치·버번·라이 등 위스키류 수입량은 2만6천937t(톤)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6.8% 늘었다.
올해를 아직 두 달 남기고 역대 연간 최대치인 2002년(2만7천379t) 수준에 육박해 사실상 올해 연간 기록 경신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위스키 수입량은 2021년 1만5천662t에서 지난해 2만7천38t으로 72.6% 급증했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3만t 선을 웃돌 것이 확실시된다.
이처럼 위스키 수입이 늘어난 것은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 사이에서 위스키에 탄산수나 토닉워터를 넣어 마시는 하이볼이 인기를 끈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하이볼을 계기로 위스키가 비싼 술에서 점차 대중적인 술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수입되는 위스키도 예전에 비해 중저가 제품이 대폭 늘었다.
올해 1∼10월 위스키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6.8% 늘었지만, 수입액은 2억2천146만달러로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위스키가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다.
한 주류업체 관계자는 "탄산수에 타 마시는데 굳이 고가의 위스키가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중저가 제품이 예전보다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1∼10월의 위스키 수입량을 수입국별로 보면 영국이 2만1천698t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영국(스코틀랜드)은 위스키 본고장으로 통한다.
영국 다음으로는 미국(3천161t), 일본(1천43t), 아일랜드(616t) 등 순이었다.
올해 위스키와 반대로 와인 수입량은 꽤 줄었다.
올해 1∼10월 와인 수입량은 4만7천500t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8% 줄었고 수입액은 4억2천678만달러로 11.6% 감소했다. 이로써 와인 수입량은 2년 연속 줄게 됐다.
와인 수입량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혼술(혼자서 마시는 술) 문화가 확산하면서 급증했다.
2019년 4만3천495t에서 2020년 5만4천127t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1년 7만6천575t으로 급증했으나 지난해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7만1천20t으로 소폭 줄어든 데 이어 올해 더 감소했다.
와인 수입량 감소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19년(-20.1%) 이후 가장 컸고 수입액이 줄어든 것은 2009년(-32.5%) 이후 처음이다.
올해 1∼10월 와인 수입량을 수입국별로 보면 스페인이 1만386t으로 21.9%를 차지해 가장 많고 칠레(8천595t), 프랑스(8천532t), 이탈리아(7천18t), 미국(4천642t), 호주(3천50t) 등 순이었다.
그러나 수입액은 프랑스가 1억7천212만달러(40.3%)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미국(6천869만달러), 이탈리아(5천817만달러), 칠레(3천963만달러), 스페인(2천601만달러), 호주(1천832만달러) 등 순이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