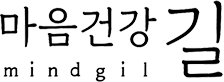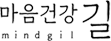내가 어렸던 시절 아버지는 가는 붓으로 ‘현고학생부군신위’라고 돌아가신 조상의 지방을 쓰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신이 찾아온다는 새벽 한시경 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고 절을 했다. 가느다란 향 연기를 타고 머나먼 곳에서 조상의 영이 찾아와 음식을 드시는 것 같았다.
문을 조금 열어둔 채 우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조상이 흠향하시도록 기다렸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지방문을 태워 그 재를 날렸다. 거기 담겼던 조상이 다시 밤하늘로 훨훨 날아가는 것 같았다.
결혼을 하고 우리 가족은 크리스찬이 됐다. 조상의 기일이 되면 꽃과 십자가를 상 위에 올려놓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올렸다. 한식과 추석이 되면 공원묘지에 있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가 그 앞에 꽃을 놓고 기도했다.
세월이 지나 내 나이가 칠십이 넘었다. 아이들은 조상을 위해 하는 추도식을 마지못해 따라 하는 것 같았다.
이년 전 나는 집안의 모든 식을 다 접기로 했다. 진정한 애정이 없이 의무로 형식으로 하는 행위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었다. 기억에 없는 조상을 위해 먼 묘지까지 아이들이 가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걱정이 생겼다. 내가 죽고 나면 평생 내가 돌보던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이 잡초 속에 버려질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풀이 수북이 자라난 버려진 남들의 묘들을 보면 마음이 애잔했다.
특히 공원묘지는 관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묘를 없애버리는 것 같았다. 공원묘지에 묻힌 유명한 코미디언의 묘지가 파헤쳐 없어지고 비석만 창고에 나뒹구는 장면을 한 방송에서 본 적이 있다. 내가 죽고 난후 공원묘지의 관리비를 자식들이 흔쾌히 낼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가기로 했다.
지난해 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쳐 유골을 상자에 담았다. 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의 유골을 내 차의 좌석에 올려놓고 오랫만에 바뀐 서울 구경을 시켜 드렸다. 오십삼년, 삼십년 만에 다시보는 서울풍경에 놀랄 것 같았다.
나는 유골을 집으로 모셔 와 얼마간 쉬시게 했다. 손자와 아들이 사는 집구경을 하고 얼마간 묵으시는 셈이다. 아름다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의 나무 밑에 묻어드릴 예정이다.
정리하는 길에 야산 기슭의 남의 땅에 방치 되어 있는 외증조할머니의 무덤도 파서 그 유골을 그 할머니가 젊은 시절 사셨다는 마을의 뒷산에 뿌려드렸다. 가족이 북에 있어서 관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아들의 제사는 뭘까. 형식보다 함께 한 즐거웠던 추억을 되살리면서 하는 아들의 감사는 아닐까.
기억의 동영상을 끝까지 뒤로 감아 재생시켜 본다. 희미한 장면들이 머리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한다. 기억들이 우글거리며 흑백영화 속의 동영상같이 나타난다. 나는 기억의 동영상을 십육배속으로 앞으로 앞으로 돌리다 재생시켜 보았다.
세 살 정도 된 내가 아버지에게 안겨있다. 아버지의 높은 어깨 위에서 차들이 오가는 길이 보인다. 다시 영상의 한 부분을 재생했다. 다섯 살쯤무렵이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나를 아버지가 깨웠다. 세발자전거가 보였다. 나는 너무 좋아서 잠도 깨지 않은 채 그 위에 올라 페달을 밟고 방안을 돌았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다. 아버지가 나를 차에 태워 학교로 갔다. ‘시발택시’라는 걸 처음 타본 날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받은 교과서들을 꼼꼼하게 은박을 한 종이로 싸줬다. 아버지의 젊음과 고뇌 그리고 늙음과 병 죽음의 장면들이 내 기억의 동영상 속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았다.
부모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닌 것 같다. 그 자식들의 추억으로 녹화되어 있다. 이번에는 추억의 동영상 마지막 부분을 재생시켜 보았다. 쌀쌀한 봄바람이 불던 날이었다. 아버지의 죽음 하루 전이다. 중환자실로 간 내게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지난밤 아주 좋은 곳으로 갔다. 아름다웠어. 그런데 병원에서 주사를 놓고 괴롭히는 바람에 가지 못했어.”
아버지의 말이 신기하게 들렸다.
저세상이 있다는 말과 글은 수없이 많이 듣고 봤지만 경험해 보지 못했다. 아버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들인 내가 믿는 바람에 아픈 몸으로 뒤늦게 세례를 받았다. 그런 아버지의 말이었다. 세뇌된 관념이나 이론은 아닐 것이다.
“아버지, 정말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아?”
“응, 있어 내가 봤어.”
아버지의 대답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믿는다. 내 아버지니까. 나는 그 말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글 | 엄상익 변호사
글 | 엄상익 변호사
경기중-고, 고려대 법대를 나오고 제24회 사법시험(1982)에 합격했다. 6공 때,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특별보좌관실에 근무하며 권부의 이면을 보았다. 변호사를 하면서 ‘대도 조세형’, ‘탈주범 신창원’ 등 사회 이목을 끌은 대형사건 피의자들을 변호했다. 글쓰기를 좋아해 월간조선을 비롯,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에 칼럼을 연재했고 수필집, 장편 소설 등 10여권의 책을 저술했다.
관련기사
- (492) 속 털어놓기
- (491) 반전의 묘미
- (490) 영정사진 속 표정들
- (489) 세 가지 선택
- (488) 인생의 작은 맛
- (487) 아마추어 연기자 시절
- (486) 신흥재벌 회장과의 싸움
- (485) 하고 싶은 일
- (484) 나의 노예적 속성
- (483) 이따금 삶에 나타나는 표식들
- (494) "나는 오늘도 글을 쓴다"
- (495) 한번에 한가지 일
- (496) 내가 돈 쓰는 법
- (497) 패키지 여행에서 만난 두 남자
- (498) 손자의 마음 밭 갈기
- (499) 결혼관을 묻는 청년에게
- (500) 크리스찬이 되는 이유
- (501) 주는 즐거움
- (502) 아버지에게 배운 이별의 기술
- (503) 광화문 덕수제과의 추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