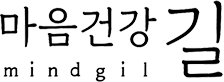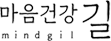아침에 일어나 글을 쓰는 데 아내가 다가와 말했다.
“친구들이 연락을 해 주는 데 당신이 전에 쓴 소재를 또 우려먹고 같은 인물이 계속 등장한다고 그래.”
그 말이 맞았다. 나는 영화감독이 한 배우를 여러 작품에 등장시키듯 한 인물이나 재벌 명문가의 얘기를 반복해서 쓰고 있기도 하다.
변호사 생활 사십년 가까이 하면서 엄청난 양의 얘기들을 들었다. 나의 벽장에는 ‘변호사 일지’가 왕조 실록 같이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그 일지가 꽂혀 있는 책장에서 날카롭게 각이 선 악취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그 일지 안에 들어있는 건 대부분이 살인과 섹스 폭력같은 것들이었다. 행간에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담겨있고 페이지마다 피냄새, 돈냄새가 배어나오고 신음 소리 절규가 흘러나왔다.
삼류소설같은 얘기들을 일상적으로 들어야 하는 게 변호사 생활이었다.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을 수사하는 자리에 입회한 적이 있었다. 여성은 강간을 당했다고 하고 인기연예인은 절대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여성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고 인기 탈랜트는 부모를 두고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하면서 일곱시간을 싸웠다.
담당검사는 내게 힘들게 공부해서 어린 시절 재래식 화장실 벽에 적힌 낙서보다 못한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걸 글로 쓴다는 것은 남이 배설한 것을 세상에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저질의 사람들이 자기들과 주파수가 맞는 그런 걸 기대해도 쓰고 싶지 않았다.
이따금씩 가난하고 착한 사람들의 변호를 했었다. 그런 때 우연히 연꽃위의 투명한 이슬방울 같은 아름다운 것들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재벌가라 하더라도 그 안에 싱그러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걸 발견하기도 했다.
한 인물이라도 그의 삶 속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담긴 경우가 있었다. 내가 자주 우려먹는 달동네에서 살다가 죽은 시인의 얘기가 있다. 소년 시절 그는 버스 조수를 하는 기술공이었다.
아직 미성년이던 그는 주요일간신문의 두 곳의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문학의 천재급이었다. 그런 재능을 보인 사람은 명문고를 다니던 작가 최인호나 황석영 정도라고 할까.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아름다운 하나의 성장소설이었다.
어른이 된 소년의 인생은 구도 소설이었다. 그의 구도 방법은 독서와 순례였다. 그는 여러차례 인도를 순례하면서 삶의 본질을 탐구했다. 먼지가 덮인 망고나무 가로수 밑에서 값싼 음식을 사 먹으면서 걸었다.
서울로 돌아오면 프리랜서로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면서 밥을 먹고 여행비를 마련했다. 그는 젊을 때 내공을 축적해서 환갑부터 그걸 종이 위에 풀어놓으려고 계획했다. 젊은날 그의 수행만으로도 두꺼운 구도소설이 될 것 같았다.
나이 육십이 되자 그는 달동네 안에 자신만의 절대적 고독의 장소를 얻어 집필을 시작했다. 이제는 잘 성숙 된 된장 간장 같은 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암이란 죽음의 초대장이 날아왔다. 그는 당황했다. 언젠가는 죽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어두컴컴한 방에서 혼자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내면의 흐름은 그가 정신과 몸으로 쓰는 또 다른 한 권의 심리소설이기도 했다. 마지막에 그는 작은 창 앞에 피어있는 이슬 맺힌 호박꽃을 보고 환희를 느낀다. 그리고 잠시 다녀간 지구별의 삶에 대해 감사했다. 깨달음과 완성의 순간인지도 모른다.
그는 찾아간 나에게 병든 자기를 먹이고 재우고 목욕시켜주는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에 감사했다. 나는 그를 통해 따뜻한 대한민국과 성공한 복지국가를 봤다. 죽어가는 시인이 헛된 정치선전을 할 리는 없었다. 그 한마디만 하더라도 생명력 있는 좋은 컬럼의 자료였다.
그 시인은 내게 소송을 부탁했다. 초기에 암을 발견했더라면 글을 쓸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며 한스러워했다. 나는 그 시인을 위로해 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 시인은 살아서 결과를 보지 못할 게 분명했다. 그러나 그에게 희망은 줄 수 있었다. 그것도 얘깃거리다.
가난한 시인은 내게 보답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평생 모아둔 책들을 단 두권만 제외하고 모두 처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옆에 두고 읽을 책만 두권 머리맡에 놓았다고 했다. 그 책은 ‘논어’와 ‘신약성경’이라고 했다. 그 건 내게 주는 귀중한 선물이었다.
어느 날 병상으로 찾아간 내게 그는 두 번째 선물을 주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글을 쓰고 싶을 때 바로 쓰라고 했다. 그와의 짧은 만남에서 나는 진주 같은 엄청난 진리들을 얻었다.
죽기 전날까지 공책에 시를 쓰던 그의 모습, 천국에서 만날 약속, 텅빈 장례식장 등 장면마다 귀한 메시지가 있었고 진리였다. 나는 그 시인의 얘기를 여러차례 우려먹었다. 등장인물은 같아도 던지는 메시지는 달랐다.
그리고 그건 사실 다른 글이었다. 내가 발견하고 틈틈이 계속 등장시키는 재벌 명문가의 얘기도 그 비슷했다. 백년을 내려오는 그 재벌가의 삶 속에는 모세가 쓴 신명기처럼 우리가 읽고 또 읽어야 할 내용이 들어 있었다. 좋은 뼈는 두 번 세 번 우려먹어도 맛있는 국물이 배어 나온다. 한 마리 소에도 뼈와 살의 부위마다 맛이 다르다.
나는 내가 발견한 연꽃 위의 이슬 같은 얘기들을 계속 앵글을 달리해서 글로 쓸 예정이다. 시각이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지는 거 아닌가. 
 글 | 엄상익 변호사
글 | 엄상익 변호사
경기중-고, 고려대 법대를 나오고 제24회 사법시험(1982)에 합격했다. 6공 때,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특별보좌관실에 근무하며 권부의 이면을 보았다. 변호사를 하면서 ‘대도 조세형’, ‘탈주범 신창원’ 등 사회 이목을 끌은 대형사건 피의자들을 변호했다. 글쓰기를 좋아해 월간조선을 비롯,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에 칼럼을 연재했고 수필집, 장편 소설 등 10여권의 책을 저술했다.
관련기사
- (267) 상속
- (266) 살아있는 자의 특권
- (265) 우주의 보상법칙
- (264) 법조인 30년
- (263) 위대한 삶
- (262) 국수가게
- (261) 낙타같은 삶
- (260) '특별한 존재'들의 선민의식
- (259) 재벌 회장의 시신기증
- (258) 관속에서의 체험
- (269) 헝그리 정신
- (270) 바닷가 실버타운의 생활
- (271) 독거노인 반창회
- (272) 강남 수천억 부자 부부
- (273) 판사들의 매매혼
- (274) 행복의 조건
- (275)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
- (276) 보험 모집원
- (277)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 (278) 시편 23장
- 황석영 "부커상 받나 싶어 두근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