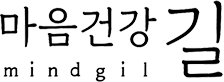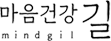나는 지독하게 미움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왔다. 맞아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어려서부터 항상 남에게 뻣뻣하고 건방지게 보였다. 그래서 매를 벌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반 죽도록 맞은 기억이 있다.

중학교 이학년 때다. 담임선생님이 방과후에 교사 숙직실 뒷 공터로 오라고 했다. 멋모르고 그 장소에 갔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벼르면서 기다리던 선생님의 주먹이 턱으로 날아오고 구두발이 무릎에 꽂혔다.
그 폭력 속에서 나는 강한 증오가 담긴 걸 느꼈다. 그 증오의 이유를 알 것 같지만 나의 변명이 될까 봐 말하고 싶지 않다. 나의 건방으로 결론짓고 싶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도 나는 건방졌다.
장기법무장교로 입대해서 처음으로 부대에 배치됐을 때였다. 나는 뻣뻣하고 건방졌다. 상관을 볼 때나 선임을 볼 때 ‘나는 나다 너는 뭐냐?’하는 식이었다. 생각해 보면 건방지고 오만할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었다.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온 나의 턱없이 빳빳한 자존심이었다. 그게 나의 갑옷으로 생각했었다.
외부에서 보기에 그건 때려죽이고 싶은 오만과 건방이었다. 정신적인 몰매가 항상 뒷통수에 쏟아졌다. “이 새끼 어디 갔어?”가 상관이 나를 묘사하는 소리였다. 그는 나를 최전방으로 쫓아버리려고 했다.
내가 되게 미웠던 것 같다. 그런 미움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같이 쌓이고 또 쌓였다. 육군 대위인 내가 제대할 때 장군인 법무감에게 신고를 하러 갔었다. 장군은 나의 신고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나는 신고를 생략하고 육군본부의 문을 나왔다. 나는 군시절부터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이었다.
그 결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끝없는 정신적 몰매가 나를 따라다녔다. 잠시 공직생활을 할 때였다. 그 기관에서 선임인 사람의 방으로 인사를 갔다. 그런데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됐다. 인사를 받는 그는 고위직 검사였다. 나는 처음보는 그의 눈에서 특유의 사람을 깔보면서 제압하는 빛을 느꼈다. 순간 본능적으로 저항의 눈빛이 간 것 같다.
꿰뚫듯이 보는 그의 눈길을 맞받았다. 그게 화근이었다.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그가 모인 사람들에게 외쳤다.
“여기 누구 이 친구 때려줬으면 좋겠어.”
그는 내가 싫었고 나는 이유를 몰랐었다. 그 기관에서의 마지막도 군시절과 비슷했다. 신고를 받는 책임자의 눈빛은 나를 싫어했고 나도 그가 싫었다. 말과 말이 튕겼다. 그리고 그는 나를 오만하다고 생각하고 그 말대로 나는 건방졌다. 개뿔도 없으면서.
실속 없이 건방진 나는 성경 속의 소경 같은 존재였다. 남의 잘못은 날카롭게 보면서 나 자신은 보지 못하고 살았다. 나에게 닥친 모든 불행이 남의 탓 세상 탓이었다. 나는 항상 억울하고 피해자였다. 그러다가 나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거울 같은 존재들을 보게 됐다.
판사 출신 후배 한 명은 고슴도치처럼 보는 것 마다 찔러댔다. 판사로 있을 때 법원의 잘못을 꼬집고 다녔다.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는 대학의 비리를 지적하고 다녔다. 변호사를 하면서 판사들에게 분노했다. 그를 보면 물기가 없고 향기도 없는 것 같았다.
그가 지적하는 손가락은 항상 남을 향해 있었다. 그는 건방지다는 소리도 들었다. 그는 뒤에서 엄청나게 언어폭력을 당하면서도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날 그가 “왜 모두 나를 보면 벌레보듯 할까?”라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나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를 보면서 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걸 깨달았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감옥까지 갔던 변호사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대학에 가서 의식화됐어요. 비로서 정의를 알았다고 생각하고 시위를 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죠. 그런데 군중이 아무도 동조하지 않고 눈빛이 냉냉 했어요.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그러다가 감옥에 가고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병이 걸렸죠. 고향에 돌아가 신문 배달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웃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더라구요. 공부 잘한다고 건방졌던 내가 싫었던 거죠.”
칠십년을 살면서도 나는 내가 보이지 않았다. 이제야 안개속의 나무같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나만 옳다고 하는 건방진 독불장군이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바보였다. 격정적이었다. 몰매 맞고 죽어도 마땅한 존재였다. 그런데도 살아있다. 부끄럽고 부끄럽다. 때때로 그분이 천사를 보내어 나를 살려주었다. 감사한다. 
 글 | 엄상익 변호사
글 | 엄상익 변호사
경기중-고, 고려대 법대를 나오고 제24회 사법시험(1982)에 합격했다. 6공 때,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특별보좌관실에 근무하며 권부의 이면을 보았다. 변호사를 하면서 ‘대도 조세형’, ‘탈주범 신창원’ 등 사회 이목을 끌은 대형사건 피의자들을 변호했다. 글쓰기를 좋아해 월간조선을 비롯,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에 칼럼을 연재했고 수필집, 장편 소설 등 10여권의 책을 저술했다.
관련기사
- (216) 실버타운 사람들과 나들이
- (215) 80대 노변호사
- (214) 추억의 국수 한그릇
- (213) 시인(詩人)
- (212) 부산 바다와 동해 바다
- (211) 교회 분란의 원인
- (210) 새들의 일생
- (208) 괜찮은 젊은 판사
- (207) 인터넷 신문
- (218) 월부 책장사 된 중학교 '주먹 짱'
- (219) 책상물림 변호사
- (220) 혼자 서있는 겨울나무
- (221) 만신창이 변호사
- (222) 천사같은 친구
- (223) 막노동 아버지의 임종 순간
- (224) 어느 시골 이발사의 질문
- (225) 일개미의 일생
- (226) 인생 3막
- (227) '울릉천국'에 사는 이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