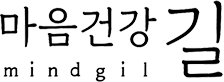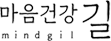중학교 삼학년 시절 나는 무기정학을 당했다. 학교의 게시판에 처벌내용이 붙었다. 모범생들만 다닌다고 알려진 당시 명문중학교에서 그런 처분은 명예의 사형선고 비슷한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정학기간 동안 어떤 학생도 나를 찾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옛날의 선비들의 귀양중의 위리안치(圍籬安置)비슷하다고 할까.
나는 내 방에서 혼자 지냈다. 나는 뚜껑이 덮인 깊고 깜깜한 우물 아래 축축한 흙바닥에 앉아있는 느낌이었다. 그 누군가 뚜껑을 조금 열고 들여다 보아 주기라도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빛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학교의 금지명령을 어기고 나를 찾아와준 친구가 있었다.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었다.
무기정학처분이 풀리고 학교를 나갔다. 다른 아이들이 색안경을 쓰고 나를 보았다. 그들은 슬금슬금 나를 기피 하는 것 같았다. 뒤에서 웃으면서 조롱하는 것 같기도 했다.
세상에 회색이 칠해진 것 같았다. 나는 처절하게 외로웠다. 그때 나는 배웠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마음의 벗’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의 벗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다. 나에 대해 나쁜 평을 들어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악평에 대해 그걸 부인하고 변명을 해 주는 존재여야 진실한 ‘마음의 벗’이라는 생각이었다.
대학 일 학년 때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봤다. 주인공이 모략을 받고 드넓은 바다 가운데 점 같이 있는 무인도에 갇혔다. 그는 파도치는 절벽 위에서 아스라이 보이는 육지를 애잔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위기에 처한 그를 구해서 자유의 땅으로 옮겨주는 존재가 있으면 참 멋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감정이 일었다.
내가 변호사가 되어 개인법률사무소를 차렸을 때였다. 마음의 오지에 붙어있던 기억의 파편 하나가 떠올랐다.
무인도의 바위절벽 위에서 바다 저쪽 자유의 땅을 바라보던 영화속 빠삐용이었다. 그런 존재에게 다가가 ‘마음의 벗’이 되어주겠다고 마음먹었다. 틈틈이 그런 사건을 찾아보았다.
돈은 오지 않아도 그런 사건은 얼른 내게 다가왔다.
삼십년 징역을 살면서 감옥에서 처절하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죄수를 발견했다. 두꺼운 가죽수갑을 뒤로 차고 감방 바닥에 엎어져 양재기 속에 든 밥을 개 같이 핥아 먹는다고 했다.
그를 찾아가 마음의 벗이 되어주었다. 재심을 신청해서 그가 자유의 땅을 밟도록 해 주었다.
그 비슷한 사건들이 많았다. 해가 저무는 광막한 사회의 들판 가운데 있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어쩔 바를 모르고 손을 허우적거리는 존재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같이 소리쳐 보기도 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 걸린다는 선동방송에 백 만명이 광장으로 몰려나온 적이 있다. 폭동 직전까지 갔다.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으로 도망갔다.
한국측 소고기 협상 대표가 매국노가 되어 변장을 한 채 도망을 다녔다. 그의 인형이 광장 한 복판에서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마음의 벗’이 되어 주었다.
그는 바람 부는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이 외롭고 힘들어 보였다. 나는 그를 철저히 믿어주기로 했다. 그는 수험생을 둔 가난한 엄마가 아이에게 사골국물이라도 끓여 먹이려면 값이 싼 소고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했다.
어린 시절 우리들은 일 년이 가야 소고기국 한 그릇도 먹기 힘들었다. 비싼 한우를 키우는 소수의 목축업자만 보호하는 것도 공평하지 않았다. 나라끼리도 주고 받아야 하는 세상이다.
우리가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팔면 뭐라도 사주어야 하는게 나라 간의 거래였다. 국내에 있는 소수의 목축업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살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억울하게 매도되어 도망 다니는 그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왔다. 위기에 처한 그를 도우면서 나는 그의 ‘마음의 벗’이 되고 싶었다.
같은 고향이거나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벗이 아니다. 모임에서 명함을 교환하고 서로의 필요로 안면을 익혀두는 것은 벗이 아니다.
‘마음의 벗’이란 어떤 것일까?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릴 때 홀로 그를 찾아가는 사람은 아닐까.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함께 날아오는 돌을 맞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글 | 엄상익 변호사
글 | 엄상익 변호사
경기중-고, 고려대 법대를 나오고 제24회 사법시험(1982)에 합격했다. 6공 때,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특별보좌관실에 근무하며 권부의 이면을 보았다. 변호사를 하면서 ‘대도 조세형’, ‘탈주범 신창원’ 등 사회 이목을 끌은 대형사건 피의자들을 변호했다. 글쓰기를 좋아해 월간조선을 비롯,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에 칼럼을 연재했고 수필집, 장편 소설 등 10여권의 책을 저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