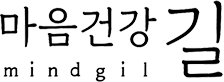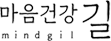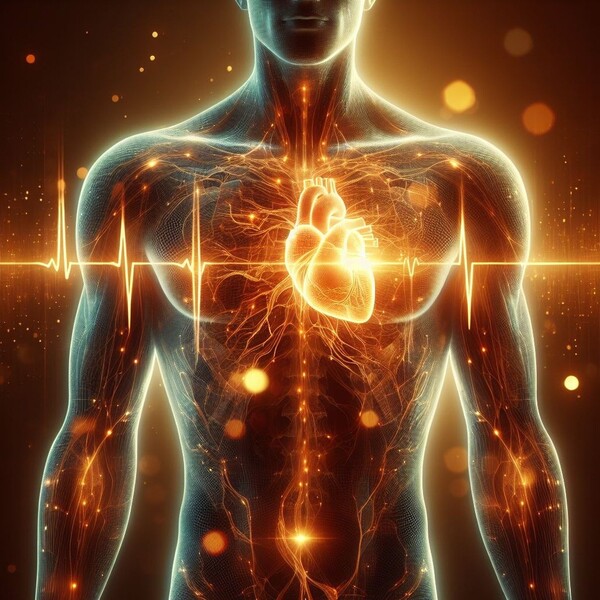
박지성, 이봉주, 박태환. 이들의 공통점은 ‘스포츠심장’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이다.
스포츠심장이란, 마라톤이나 축구, 수영 등 지구력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정기적으로 시행한 운동선수들에게 볼 수 있는 심장으로, 일반인에 비해 좌심실의 용적이 크며 벽이 두껍고 심장맥박이 느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스포츠심장은 한 번의 심장 박동을 통해서도 많은 양의 혈액을 공급할 수 있어, 박동이 느리고, 호흡곤란 같은 증상 없이 지속적으로 운동이 가능하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일반적인 심장이 1분에 70~80번 박동할 때, 스포츠심장은 40~50번 박동한다.
그런데 최근 운동선수처럼 과격하게 운동하는 젊은층이 많아지면서 일반인 중에서도 스포츠심장의 소유자들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해지고 있다. 스포츠심장은 운동기능을 향상시키지만, 자칫하면 급사를 유발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스포츠심장이 상대적으로 심장근육과 관상동맥이 딱딱해지는 석회화의 위험을 높이고, 부정맥이나 급사위험이 큰 부정맥 심방세동을 젊은 나이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명대동산병원 심장내과 한성욱 교수는 “보고에 따르면 스포츠심장은 심장근육 섬유화 및 관상동맥 석회화(심장근육과 관상동맥이 딱딱해지는 것) 위험이 높고 급사위험이 큰 부정맥 심방세동이 젊은 나이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중앙대병원 순환기내과 강기운 교수는 “심장근육이 두꺼워지면 심장의 전기자극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고 1회 박출량이 감소해 어지럼증, 실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밀히 말해, 스포츠심장은 고강도운동에 의한 정상적인 심장변화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인 것은 아니다. 또 일정 기간 운동을 중단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스포츠심장으로 변했는데도 대부분 증상을 체감할 수 없어, 자신의 심장에 일어난 변화를 모른 채 계속 운동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정보영 교수는 “운동량을 줄인 후 5년이 지나도 약 20%는 심장크기가 유지됐다는 보고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성욱 교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 전 심초음파·심전도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운동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며 “운동 시작 후에도 주기적으로 심장상태를 점검하면 급사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주 4~5회의 유산소 운동과 주 2회의 근력운동이 적절하다.
강기운 교수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심장건강에는 일반적으로 주 4~5회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운동(빨리 걷기, 달리기, 자전거 등)과 주 2회 근력운동을 병행하는 정도가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