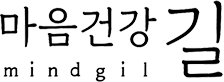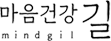초등학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다. 그는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리고 가정환경도 비참했다. 책임지지 못할거면서 왜 자기를 낳았느냐고 집을 나간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소년이었다.
그는 돈을 벌면서 대학을 다녔다. 일년을 벌어 일 년을 다녔다. 팔 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무역업으로 성공했다. 뉴욕과 홍콩, 여의도에 부동산을 가진 부자가 됐다. 주로 외국에서 살기 때문에 거의 보지 못했다. 눈에서 멀어지면 친구 관계가 옅어지는 것 같았다.
몇 년 전 내가 적극적으로 그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다. 그는 어린 시절 나의 추억이었다. 그나 나나 나이가 어느새 나이 육십대 중반을 넘겼을 때였다. 그가 어떤 아름다운 색깔로 노년의 여백을 채우는지 궁금해서 물었다.
“사업도 성공하고 돈도 벌었는데 노년을 어떤 즐거움으로 보내시나?”
“노년의 낙이라고 하는 게 여행과 산보 그리고 속을 털어놓는 친구와 만나는 거지.”
“그런 친구가 많은가?”
“거의 없어. 내 고등학교 동창이 삼백명인데 지금 같이 골프를 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친구는 오십명 정도야. 그 중에서 같이 치는 친구는 다섯명 정도라고 할까. 그런 친구마저 만나면 비교하고 속을 털어놓지 않아. 그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야. 그건 친구가 아니라 지인 정도라고 해야겠지.
학교 때 단짝인 친구가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퇴직을 하고 오피스텔 경비를 하고 있어. 다른 한 명은 술만 마시고 백수같이 지내고 있어. 환경이 달라지니까 더 이상 만나기가 힘들어. 동창이고 수십년 된 친구고 뭐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환경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차이가 나니까 말이야.
이제는 옛친구라고 만나보면 심드렁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 쓸데없는 정치논쟁이나 하고 헤어지고 나면 마음이 개운치가 않아. 돈도 그래. 만나면 밥을 사고 술도 사는데 작은 액수가 아니야. 그 돈을 내가 왜 써야 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야. 차라리 가족하고 맛있는 것 먹고 손주들에게 용돈 주는 게 낫지.
친구 다 소용없어. 그래서 다 정리해 버렸어. 차라리 지금 사는 집의 이웃사람들이 훨씬 좋아. 환경이 비슷하고 서로 속을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고생을 하면서 세월을 보낸 그의 말 속에는 현실의 체험에서 얻어낸 통찰이 들어있었다. 그가 말을 계속했다.
“우리들이 소년 때에는 매일 만나고 평생 우정을 가지자고 맹세하고 은반지까지 똑같이 만들어 끼었었지? 허허”
우리는 중학 시절 그랬었다. 그는 어린시절의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가 내게 이런 충고를 했다.
“내 기억으로 너는 외아들 증후군이 있는지 쉽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 성격이었어. 경쟁심이 있어서 남과 비교하기도 하고. 살아보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통해 교류를 하지. 그런데 너는 술을 먹지 못하잖아? 이제부터는 고독을 즐기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같은 나이지만 고통이 많았던 그는 어려서도 어른스러웠었다. 그는 항상 먼저 깨닫고 내게 형같이 행동했었다. 그는 젊은 시절의 나를 적나라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마음 문을 열고 속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속에 뭐가 은밀히 있길래 털어놓지 못했던 것일까. 내가 속을 털어놓는지 아니면 문을 닫아걸고 감추는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나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산 셈이다.
사람들은 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감추고 숨기고 하는 것일까. 사십 년 가까이 변호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숨기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보았다. 양심에 꺼리는 일을 했거나 불륜 같은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걸 숨기는 건 당연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열등감이 있고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속을 털어놓지 못하고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 내 경우 속을 털어놓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면 자존감이 약한 그쪽일 것 같았다.
나는 어둠침침했던 내면의 창문을 열고 햇볕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했다. 사도 바울은 자랑이 아니라 약점만을 남에게 얘기한다고 했다. 나는 글에서나 사람을 만날 때나 그 누구에게라도 가급적 속을 털어놓기로 했다. 내면에 별로 숨길 것도 없는데 감추고 남에게 보이기를 꺼려했었다.
내가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리니까 상대방들도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이웃이 생기고 늙어서의 친구가 생기는 것 같았다.
며칠 전 저녁 한 언론인을 만났다. 메이저신문의 사회부장을 거친 중진이었다. 서울 온 길에 갑자기 그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 특별한 업무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저 잠시 같이 차를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다른 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내게로 왔다. 내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회에서 만났어도 속을 털어놓기 때문이다. 내남없이 인간이란 거기서 거긴데 왜 꽁꽁 숨기려고 했는지 알 수 없다.
인간이란 마음이 흐르는 사람과 친구가 되기 마련이다. 여백이 있어야 남이 들어갈 수 있기도 하다. 젊어서부터 마음 문을 좀 더 활짝 열어 제쳤더라면 많은 친구들이 복을 선물로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아이들과 손녀 손자에게 그런 지혜를 전해주고 싶다.
 글 | 엄상익 변호사
글 | 엄상익 변호사
경기중-고, 고려대 법대를 나오고 제24회 사법시험(1982)에 합격했다. 6공 때,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특별보좌관실에 근무하며 권부의 이면을 보았다. 변호사를 하면서 ‘대도 조세형’, ‘탈주범 신창원’ 등 사회 이목을 끌은 대형사건 피의자들을 변호했다. 글쓰기를 좋아해 월간조선을 비롯,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에 칼럼을 연재했고 수필집, 장편 소설 등 10여권의 책을 저술했다.
관련기사
- (491) 반전의 묘미
- (490) 영정사진 속 표정들
- (489) 세 가지 선택
- (488) 인생의 작은 맛
- (487) 아마추어 연기자 시절
- (486) 신흥재벌 회장과의 싸움
- (485) 하고 싶은 일
- (484) 나의 노예적 속성
- (482)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 (483) 이따금 삶에 나타나는 표식들
- (493) 아버지 제사
- (494) "나는 오늘도 글을 쓴다"
- (495) 한번에 한가지 일
- (496) 내가 돈 쓰는 법
- (497) 패키지 여행에서 만난 두 남자
- (498) 손자의 마음 밭 갈기
- (499) 결혼관을 묻는 청년에게
- (500) 크리스찬이 되는 이유
- (501) 주는 즐거움
- (502) 아버지에게 배운 이별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