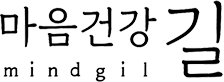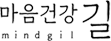지금은 너무 진부해서 사라진 드라마 속 남녀다툼의 단골 대사가 있다.
“ 왜 이래? 너 답지 않게 ”
“ 나 다운 것? 나 다운게 대체 뭔데?! ”
내가 가꾸어온 ‘나 다움’ 이지만 그 안의 ‘진짜 나’를 모르면서 함부로 아는 체 하지 말라는 뜻일게다.
코로나가 모두의 얼굴에 한개의 마스크를 쓰게 했지만, 스위스의 정신분석 학자 카를 융 (1875 - 1961) 은 이미 우리의 마음엔 보이지 않는 천개의 마스크가 있다고 했다.
융의 마스크는 페르소나(persona)로, 타인에게 비치는 사회적, 외적 성격이다. 페르소나가 사람(person) 이나 성격(personality)의 어원이기도 한 것을 보면, 인간은 평생 가면과 뗄 수 없는 운명을 가진 것 같다.
가면은 나쁜 것일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 듯, 페르소나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우리의 세상은 실상 멋들어진 페르소나들이 지탱하고 이끌어간다.
누구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면을 쓰고 싶어한다. 다만 페르소나가 ‘참 자기(true-self)’와 지나치게 다를 때, 인간은 행복해지기 어렵다. 행복한 사람일수록, 페르소나와 ‘참 자기’의 얼굴이 멋들어지게 어우러진다.
페르소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출발했다. 마스크 없이 외출을 못했던 것 처럼, 출근을 하며 생업의 가면을 주섬주섬 쓰는 것처럼, 그리스의 연극배우들 또한 무대에 오르기 전 항상 가면을 써야만 했다.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의 가면은 대사를 전달하기 위해 입 부분이 열려있었다.
그리스의 연극무대는 세명의 남성만 올라야 하는 규칙이 있었기에 가면의 사용은 필수적 이었다. 남녀노소의 역할을 번갈아가며 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멀리서도 역할의 구분이 확실하게 보여야하니 표정의 과장이 도드라졌다. 대표적인 가면의 표정은 웃음과 울음, 희극과 비극이였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예술을 관장하는 9명의 뮤즈가 있었다. 그 중 멜포메네(Melpomene)는 비극의 여신이다. 머리에는 사이프러스 나무 관을 쓰고 손에는 비극의 가면과 단검을 들고 장화를 신은 모습으로 표현된다.
탈리아(Thalia)는 ‘풍요와 번성’ 의 뜻이 담긴 희극의 여신으로 담쟁이 덩굴 관을 쓰고 희극의 가면을 들고 샌들을 신고 있다. 비극과 희극, 이 두 개의 가면은 지금도 연극(drama)를 상징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식이다.
독일 미술사학자 빙켈만이 주장한 고대 그리스의 미의식- 숭고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성- 은 무대 위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희극과 비극이 버무려진 디오니소스(Dionysus)의 원초적 본능이 가득한 고대 그리스 연극에는 격정과 소란스러움, 해학과 풍자가 가득 했다. 디오니소스가 포도주의 신이기도 하기에 가면은 와인을 마실 때 더욱 느낄 수 있는 행복과 슬픔의 감정을 나타낸다.
2천여년간 지속된 고루한 서구사상에 염증을 느낀 니체(1844~1900)는 소크라테스부터 출발한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맹신이 그리스인의 본능을 잃게 하였고, 결국 서구사회를 불행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예술의 정수는 <라오콘>이 아닌 그리스의 비극 이었다.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 따르면 조형예술과 이성을 상징하는 아폴론적 예술과 해체의지인 광기와 음악으로 대표되는 디오니소스적 예술의 긴장과 균형 속에 예술의 정수인 비극이 탄생한다. 결국 그리스 예술의 근원은 디오니소스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려견 슈나우저를 닮은 니체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웃음을 매우 사랑했다. 왜 인간만이 웃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일까? 니체의 답은 인간만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겪기에 어쩔 수 없이 웃음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삶의 허무함과 나약함을 비웃는 초인(Übermensch)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니체의 이 아이러니한 웃음의 정의는 희극과 비극이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 이라는 명언을 남겼고 서양 경구에 ‘비극에 시간이 더해지면 희극이 된다’ 라는 말이 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슬프지 않은 인생이 없고, 시간을 이겨내는 슬픔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문예가 장 드 라브뤼예르(1645 ~ 1696) 도 ‘삶은 생각하는 자에겐 희극, 느끼는 자에겐 비극’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은 니체의 예술관과도 흡사하다.
삶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인간이 선천적인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선 생각이 필요하다는 뜻 아닐까? 웃음이란 뜻밖에도 매우 지적인 활동의 부산물일 수 있다.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조화는 삶 속에서도 유효하다.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로 알려진 인지 행동 치료(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의 창시자 앨버트 엘리스(1913~ 2007) 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 고통은 자신과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라 한다. 그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이 ‘비합리적 신념’ 을 (비)웃음으로서 허물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항상 성공해야만 한다’ 나 ‘나는 누구나에게 사랑받아야 한다’ 는 참으로 얼마나 멍청한 믿음인가.

<비극과 희극 사이의 데이비드 개릭>(David Garrick Between Tragedy and Comedy, 1761)은 영국 화가 조슈아 레이놀즈 (Joshua Reynolds, 1723 – 1792) 의 그림으로, 비극과 희극의 뮤즈 사이에 있는 한 배우를 묘사하고 있다.
그는 탈리아와 멜포메네 사이에서 갈등한다. 비극의 뮤즈는 단검을 들고 있고, 희극의 뮤즈는 가면을 들고 있다. 비극의 특징은 닫힌 결말이지만 희극의 결말은 항상 열려있다. 비록 그것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어리석음일지라도, 우리는 그가 끝내 탈리아에게 가길 기대한다.
‘나 다운게 뭔데?’ 라는 드라마 대사가 구려진 것처럼, 멀티 페르소나로 살 수 밖에 없는 현대에는 페르소나도 참 자기의 일부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단일화된 인격의 신화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희극과 비극의 가면을 택하는 것엔 정답이 있지 않을까?
오스카 와일드가 말한 것 처럼, ‘인생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중요하다.’ (Life is too important to be taken seriously)’. 
 글 | 임성윤 교수
글 | 임성윤 교수
미국 샌프란시스코 예술대를 거쳐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예술가의 심리와 문화' 에 관한 주제로 미술교육/예술경영 철학박사(PhD)를 취득했다. 인디애나 대 공중보건대학 방문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평택대 상담대학원, 미술치료학과에서 미술심리상담과 함께 예술과 인문학, 신경과학을 통한 창의적 치유를 위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미술심리상담 전문가 (PATR) 이다.
키워드
#임성윤의 미술치유 #비극과 희극의 사이 #페르소나 #참 자기 #나 다운 것 #가면 #연극 #예술 #미술 #미술치유 #외적 성격 #카를 융 #마음 #마스크 #진짜 나 #탈리아 #멜포메네관련기사
- 라오콘의 표정과 앙소르의 가면
- 치유의 아그리파 석고상 - ‘있는 그대로’
- 위대한 짝다리 – 콘트라포스토(Contrapposto)
- 비너스와 석굴암- 황금비율과 마음의 평화
- 플라톤과 고갱의 의자
- 아름다움의 본능 - 미학적 인간
- 여성을 유혹하기 위한 제우스의 변신
- 제주 화가 이왈종의 새로운 도전
- 예술로 마음 치유하는 '아트테라피'
- 예술가들의 '마지막' 작품을 들여다보다
- "베르디 오페라는 모든 민족·시대에 경고한다"
- 도마뱀·강아지·인간
- 거울 통해 표현된 인간의 온갖 욕망
- "김대건 신부 조각상 만들때 기적같은 일 많았다"
- 다가오는 2024년…'푸른 용'의 해
- 프랑스 '좋았던 시대'(벨 에포크) 모습은?
- ‘고도를 기다리며’ 와 ‘생명의 나무’
- 추사 김정희와 르누아르
- 중세 고딕성당과 영화 '밀양'의 빛
- 추락과 비상의 미학
- 조선과 중세유럽 미술 속 감각
- 신화속 '아마조네스' 여전사 왕국 실재했나?
-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와 스마트폰